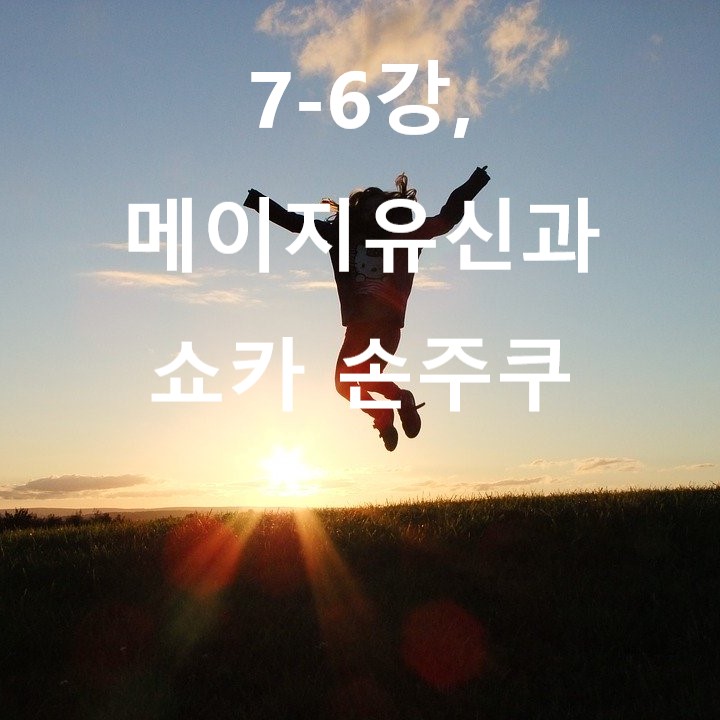
이번 강의에서도 뒤통수를 한대 또 얻어맞았습니다.
나는 어떻게 살아왔고, 나는 어떤 사람인지...
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했는지 반성이 많이 됩니다.
어쩌면 교수님 말씀처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.
하지만 우리의 자존을 위해 깨트려야 합니다.
"종속성"
- 우리들의 삶의 습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바로 '종속성'(따라하기)이다.
→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꾸려본 적이 없고,'
→ 우리가 한 생각대로 살아본 기억이 없다.
→ 조선시대에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대로,
→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대로,
→ 그 뒤로도...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본 기억이 없다.
- 수출하고 있는 무수한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들 것이 단 하나도 없다.
→ 물건뿐만 아니라 제도도 마찬가지이다.
→ 우리는 지금까지 '따라 하기'를 너무나 잘해왔다. 하지만 '종속적'이다.
- 문명은 '생각'이 만든다.
→ 종속적이라는 것은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다.
→ 그러면 이 기준이 '기능'을 한다.

"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세상을 대한다."

- "기준은 과거다."
→ 우리나라 사람들은 '과거로 돌아가야 진실한 삶을 사는 것'으로 느낀다.
- "기준은 구분하는 것이다."
→ '이익이 있느냐, 없느냐' 보다 '맞냐, 안 맞냐'를 더 중요시한다.
→ '강하냐 약하냐' 보다 '착하냐 악하냐'를 더 중요시한다.
- 내 기준으로 세상을 대한다.
→ 내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.
→ 우리는 "착하고 정확한 작은 사람"이다.
" 굵고 큰 사람이 사라졌다."

- '굵고 큰 사람'은
→ 이미 있는 기준을 돌파한다.
→ 아직 오지 않는,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.
- '착하고 정확한 작은 사람'은
→ '보이지 않는 곳'으로 나아가지 않는다.
→ '견적'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다.
→ 지식의 생산이 없다. 하지만 지식의 생산은 무모한 보폭에서 시작된다.
" 문명의 진화와 주도권은 무모함에서 나온다. "
- 문명의 진화와 주도권은 누가 더 정확하냐, 누가 더 착하냐에서 나오지 않는다.
→ 누가 더 황당무계하냐?, 누가 더 무모하냐에 따라 문명의 진화와 주도권이 정해진다.
- 조금 더럽고 악하더라도 굵은 것이 났다.
→ 깨끗하고 정확하더라도 작은 것은 매력이 없다.

" 도전은 없고 정확성만 따진다. "
- "정확성은 도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."
→ 일본의 노벨 수상자의 인터뷰에서 "당신에게 과학은 어떤 것인지?" 물었을 때 " 과학은 도전이다. "라고 답했다.
→ 정확성이 도전에 의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위해 사용되고 봉사하는 것뿐이다.
- 모든 지식, 제도, 물건은 문제와 불편의 해결의 산물이다.
→ 문제와 불편을 해결하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.
→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은 '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'이다.

" 착하고 정확한 작은 사람은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한다. "
- ' 착하고 정확한 작은 사람'은 불안감을 감당하지 못해 계속 안전한 쪽으로 간다.
→ 반대인 사람은 불안을 감당하고 모르는 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간다.
- 우리 민족. 사회가 발전하고 상승하는 방법은 질문하고, 찰기시하는 것이다.
→ 하지만 우리 모두의 자식은 '안전'하게 키운다.
→ 머리 좋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공무원 준비만 한다.

" 메이지유신과 쇼카 손주쿠 "
- 서양이 조선, 일본, 중국을 침략할 당시 조선에는 약 400여 개의 향교, 서원이 있었다.
→ 모두 국립, 사립학교로서 다 공무원이 되는 준비만 하고 있었다.
→ 모두 있는 것만 주구장창 외우고 있었다.
- 반면 일본 쇼카 손주쿠의 작은 '사숙'(사사로이 글을 가르치는 곳) 약 90명이 공부하고 있었다.
→ 혁명 기간 동안 절반이 죽고, 절반이 살아남아 '메이지유신'을 일으킴
→ 작은 사숙에서 아직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,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려했음
→ 우리는 이런 사숙하나 이기지 못했다.
"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다. "
-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? 지금은 단순히 앉아서 토론하고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.
-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다.
→ '대답'하는 습관은 '질문'하는 습관으로 바꾸고,
→ '안전을 원하는 작은 마음'은 '없고,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는 큰 마음'으로 바꾸어야 한다.
- '혁명'이라고 부르는 이유는
→ 거의 불가능하고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.
→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.
→ 우리의 자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.
이것이 바로 " 새 말 새 몸짓 "을 주장하는 이유이다.
'배움의 행복 > 최진석의 장자철학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<최진석의 장자철학> 8-2강, 햇볕아래 졸고있는 고양이와 무소유 (0) | 2019.12.02 |
|---|---|
| <최진석의 장자철학> 8-1강 합의된 기준이 폭력을 만든다. (3) | 2019.11.29 |
| <최진석의 장자철학> 7-5강 우리는 나를 가두는 우리다. (0) | 2019.11.23 |
| <최진석의 장자철학> 7-4강 자유, 독립, 존엄을 지키는 삶 (0) | 2019.11.20 |
| <최진석의 장자철학> 7-3강 더러운 도랑 가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살겠다 (0) | 2019.11.17 |